
마곡사에 눈이 내렸다. 탐스런 눈송이가 소나무 가지 마다 둥글게 내려 앉았다. 절집이 더 깊이 고요하다.
겨우내 눈을 굶고 지내다 호남지방 폭설 소식에 귀가 번쩍, 영하 7℃의 새벽 공기 속으로 입김을 뿜으며 고속버스를 탔다. 지난밤 광주에 사는 친구가 폭설 소식을 전해주며 충동질한 게 결정적인 동기였다. 시가지가 마비될 정도로 눈이 많이 왔다는데, 거기 가서 갇힐지도 모르는데, 아니 내심 눈 속에 갇히길 바라면서 차를 탔는지도 모른다.
폭설 소식에 부랴부랴 찾은 광주
둥근 설경 속 고즈넉한 양림동은
한옥과 자연 어우러진 한 폭의 그림
풍성한 문화예술보다 반가웠던 건
향토에 대한 애착 가득한 문화해설사
광주의 설경은 둥글었다. 모난 건물도 수직의 나무도 눈으로 둥글게 덮이고 차량도 사람도 둥글게 굴러다녔다. 천사의 비듬처럼 나풀대는 눈을 맞으며 양림동을 찾았다. 조선 오백 년 역사와 근대문화가 정답게 어우러진 곳이며 문화 예술이 숨 쉬는 곳이라고 했다.
20㎝ 가까운 적설에 마을은 고즈넉하게 묻혀 있었다. 개화기의 대표 가옥들을 찾아 한발 한발 눈 속에 발자국을 찍는 재미라니! 대문을 두고 쪽문으로 살짜기 들어서서 쌓인 눈을 다치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발을 내디뎠다. 한옥 지붕의 우아한 곡선과 눈을 둘러 쓴 정원수가 어우러져 한 장의 캘린더 사진이 완성되었다. 이 집에 살던 선비는 눈 내리는 날 정원을 내다보며 어떤 시를 읊었을까, 행여 내 친구처럼 벗을 불러 눈 구경을 나서진 않았을까.
그치는 듯 다시 내리는 눈을 맞으며 고옥을 한 바퀴 돌고 있는데 행랑채를 지키던 남자가 다가와 불쑥 뱉는다.
“신발에 눈 좀 털고 다니랑게요. 축담이 더러워진당게.”
발이 푹푹 빠지도록 눈 깊은 마당을 걷다가 축담에 올라서니 깨끗하게 쓸어놓은 축담이 더러워질 밖에. 남자는 우리 뒤를 따라오며 비질을 하며 투덜거렸다. 아무도 오지 않아 조용했는데 느닷없이 두 여인이 나타나 눈을 밟고 헤집어대니 심기가 불편했던 모양이다. 발 끝을 따라오는 빗자루가 무서워 집을 대충 한 바퀴 돌아보고 나왔다.
양림동은 개화기 광주의 많은 역사가 남아있는 곳이며 광주 5대 부자들이 살던 곳이다. 호남 선교의 중심지이자 광주 근대화의 시발점이기도 했던 이곳은 20세기 초에 지어진 회색 벽돌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성자들의 마을이기도 하다. 먼 길을 달려와서 이 유서 깊은 곳의 설경을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아쉬울까. 빗자루가 아닌 포크레인이 뒤를 따라와도 볼 건 다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광주천을 건너가 점심을 먹고 다시 양림동으로 넘어왔다. 오거리 건물 벽에 붙은 마을 안내도를 보며 남은 시간에 이 넓은 곳을 어떻게 돌아볼까 궁리하고 있을 때였다.
“눈 오는 날 양림동에 오셨네요 잉. 어딜 찾으신다요?”
까만 모자를 쓴 맑은 눈의 한 남자가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금방 알아차리고는 양림동을 효과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코스를 알려주마고 했다. 친구가 다구를 가지고 온 탓에 무인찻집을 물었더니 그는 흔쾌히 자신이 일하는 사무실로 가자고 했다.
“오늘은 폭설로 모두 출근을 안 해 사무실이 비었습니다. 편하게 앉아 차 드세요.”
그는 문화해설사로 일하는데, 오늘 같은 날 혹시라도 동네를 찾는 사람이 있을까봐 나와 봤다고 한다. 폭설로 길이 끊긴 도심을 걸어 자신이 사랑하는 동네를 둘러보러 왔다는 남자. 단순한 직업의식을 넘어 그 남자에겐 향토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물씬 느껴졌다. 보수나 대가를 생각하지 않는 순수한 그 마음에 작은 감동을 느꼈다.
남자의 안내로 펭귄마을을 거쳐 오웬기념관을 비롯한 근대 건물들을 둘러보았다. 빨갛게 열매 맺은 호랑가시나무와 낡은 벽돌 건물들, 아무도 밟지 않은 눈 깊은 정원. 바람이 불자 호랑가시나무에 쌓였던 눈이 머리 위에 꽃비처럼 쏟아지고…. 이 모든 정경은 그 남자의 안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눈 때문에 길이 끊어진 동네에서 초행인 우리가 어딜 제대로 찾아가 볼 수 있었겠는가. 둘이 몇 시간을 헤매도 보지 못할 것들을 두어 시간 만에 속속들이 다 찾아볼 수 있었다. 양림동을 제대로 볼 수 있어 좋았다기보다 사람을 제대로 만나 횡재한 기분이었다. 축담에 눈 묻을까봐 빗자루로 쓸면서 따라오는 사람을 또 만났더라면 광주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았을 게다.
시나브로 내리던 눈이 그치고 맑은 하늘 아래 눈 덮인 무등산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낮게 엎드린 어머니처럼 도시를 지키고 있는 그 산이 새삼 아름답고 숭고해 보였다. 자신의 존재를 내세우지 않으면서 향토를 아끼며 사랑하는 그 남자도 멋져 보였다. 그 추운 날, 낯선 이방인에게 동네를 안내해주며 돌아가는 그 남자의 얼굴이 푸르딩딩하다는 걸 뒤늦게야 깨달았다. 거울을 보니 내 얼굴도 눈바람에 시퍼래져 있었다.
폭설의 초대를 받고 달려간 곳에서 설경보다 아름다운 사람 풍경을 보고 왔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풍경이 되고 싶다.

■ 강옥씨는
·문화일보 수필부문 등단(1994년)
·울산문학상 수상(2008년)
·수필집 <내 마음의 금봉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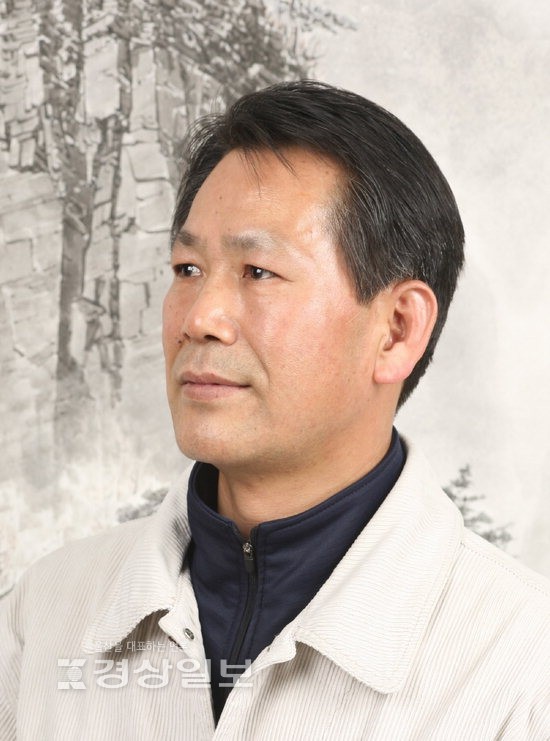
■ 강상복씨는
·한국화가
·개인전 9회(서울 울산 청송)
·1994 동아미술상 수상(국립현대미술관)
·오, 서울!(갤러리 라메르)
·한국화大作展(한국미술관)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한국미협 한국화분과 이사
·후소회·호연지기 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