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산을 이고 사는 사람들-10)천황산표범과 배내골포수

#곰, 승냥이 설치던 배내구곡 청수골
하늘이 막힌 배내골에 대한(大寒) 동장군이 찾아왔다. 대밭(죽전)에 사는 정 노인이 꽁꽁 언 개울을 건너 사립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은 아침밥상이 들어오기 전이었다. 정 노인은 마당에 들어서기가 바쁘게 범이 내려왔다고 방정을 떨었다. 염소막에서 키우던 염소를 벌써 몇 마리째 잃어버렸는데, 오늘 아침엔 머리통만 남아 있더라는 것이다. 눈치빠른 김 포수는 정 노인의 입 모양을 보고 말귀를 알아차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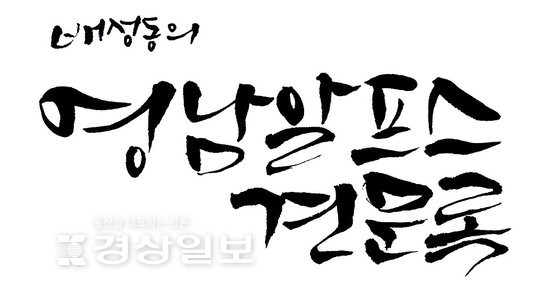
애를 달구던 폭설이 수그러들자 김 포수는 백련마을을 빠져나와 청수골을 탔다. 청수골은 배내구곡(梨川九谷) 중에서 가장 물이 맑다는 골짜기로, 한피기고개를 넘어 신평장으로 가는 장길도 끼어 있었다. 그의 어깨는 무쇠 같았고 손은 돌처럼 거칠었으나 발걸음만은 살쾡이 마냥 조심스러웠다.

개털모자에 솜이 든 무명 핫바지 차림의 김 포수 손에는 도사 지팡이(감태나무)가 들렸다.
산을 오르면서 내려다 본 배내골은 독안에 든 쥐였다. 백 섬 하는 부자가 없는 가난한 배내골은 산돼지 한 마리면 마을사람 모두가 배가 터지게 먹을 수 있었다. 죽전마을 대밭은 임진왜란 의병들의 군사 화살로 쓰였던 이대(왕대)라는 대나무가 무성했다.
그는 음달인 ‘돌님이골’로 들어가 된비알에 설치해둔 올가미를 확인했다. 사냥꾼들이 올무를 칠 땐 짐승이 다닐만한 길목에 보이는 발자국을 보고 친다. 멧돼지도 잡을 수 있는 강한 올무 강철선이라도 단단히 고정하지 않으면 힘센 놈은 나무 째 뽑아내고 빠져나갈 수 있었다.
가난한 배내골 홀갱이꾼, 모피가 될만한 짐승은 다 잡아
상처없이 잡아 모피의 상품가치 높이려 곳곳에 올무 쳐
올무에 걸린 표범은 처마에 걸어도 꼬리가 땅에 닿아
부산에서 당시 100만원에 거래돼 아직 보관되고 있을듯

한참을 오르자 백발등 억새만디가 나왔다. 백발등은 멀리서 보면 흡사 백발노파가 흰머리를 풀고 있는 모습을 했다. 배내골 골짜기에서 물밀듯 밀려오는 억새바람이 새살댔다. 억새밭에 숨어있던 표범을 만나 소스라쳤던 기억이 오롯이 되살아나 잰걸음으로 빠져나왔다. 김 포수는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된비알에 쳐둔 올무에서 수확한 족제비를 부대자루에 넣어 지게짐을 했다. 그가 노리고 다니는 짐승은 여우와 족제비였다.
산간오지 마을마다 족제비 잡는 홀갱이꾼들이 있었다. 배내구곡에는 갈가지라 불리는 살쾡이가 많았다. 하지만 검은 살쾡이 털보다는 노란 족제비 털이 비쌌다. 꼬리와 목털에서 나오는 족제비 붓은 최고로 쳤다. 호피장수가 찾는 고급 털가죽은 상처가 없어야 했다. 상처 없는 짐승을 잡으려면 산에 자주 오르내리며 올무에 걸린 짐승을 하루빨리 수거해야 했다. 올무에 걸린 짐승을 오래 두었다간 썩거나 굶주린 산짐승이 뜯어 먹어 상품가치가 떨어졌다. 함정을 파는 경우도 있지만 험한 산중에서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함정 사냥을 할 때는 먹잇감으로 유인해 끝이 뾰족한 대창을 바닥에 설치해야 했는데, 이 경우 배 부위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 또 큰 바위 밑에 둔 유인용 먹잇감을 빼다가 압사시키는 사냥술은 두개골이 어스러졌다.
그는 청수좌골 양지녘 ‘솜봉넘’으로 내려갔다. 범을 봐도 겁내지 않을 포수였지만 하산 길에서는 자주 넘어져 다치곤 했다. 넘어지면 한참을 누워 있었다. 잃어버린 염소 뼈다귀는 무인지경 골짝에서 발견되었다. 사발만한 눈발자국에 괸 핏자국으로 봐선 염소를 잡아먹은 짐승은 조금 전에 지나간 것으로 보였다. 그는 짐승 발자국의 패드 상태나 배설물의 건조에 따라 지나간 시기를 알아보았다. 천황산으로 난 사발 발자국을 추적하던 그는 해가 그렁그렁 떨어질 무렵에서야 마을로 내려왔다.
#1980년 배내골에서 잡힌 천황산표범
다음 날, 아침을 든든히 차려먹은 김 포수는 천황산 층층골을 열었다. 지난 밤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 끈을 당겨보라 하셨다. 주운 끈에서 황소만한 호랑이가 달려올 것 같은 사냥꾼 특유의 예감이 들었다. 김 포수는 이중 홀치기를 쳐둔 층층골 된비알을 탔다. 영리한 짐승이 다닐만한 데는 올무보다 강한 목메(이중 홀치기)를 놓았다.
범틀에 걸려 있는 표범을 발견한 곳은 층층골 7부 능선이었다. 실한 참나무 밑동에 쳐둔 이중 홀치기에 걸린 줄무늬 표범이 기진맥진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 목메를 끌거나 몸부림칠수록 더욱 옥죄었다. 막상 걸려든 표범을 보자 겁이 난 그는 날듯이 산을 내려와 아들을 시켜 살티 총잡이를 불렀다.

“그때가 제 나이 18살이었심더. 아버지는 귀가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급히 선리 술도가로 내려가 살티 이한근 포수에게 전화를 걸었심더. 당시만 해도 낙후된 배내골에선 선리 술도가로 쫓아가 다이얼 전화를 돌리던 때였어요. 아제요, 아부지가 큰놈 잡았소. 퍼뜩 오이소. 그러면 알아들어요. 동네 장정 네 사람 델고 올라갔어요. 앞발이 올무에 걸린 사나운 표범이 우리에게 달려들려고 해서 가까스로 마취총을 쏘아 잡았죠. 당시 총이 있는 포수들은 마취제를 휴대하고 다녔어요.”
실제 표범을 목격한 김 포수 아들의 말이다. 가난한 배내골 홀갱이꾼들은 호피가 될만한 짐승이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올무를 놓았다. 영축산 북능 청수골만 해도 수십 개를 깔았다. 새가 울어도 무서운 골밖골, 일 년 내내 볕이 들지 않는 돌님이골, 가도 가도 겹치기 산인 층층골, 바람만 불어도 징 소리가 들리는 징골, 무인지경 삼박골, 조선시대 사기를 굽던 옹기골에도 그랬다.
“말을 못하는 아버지는 그 놈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녔어요. 1980년 초순이었어요. 천황산 층층골 7부 능선에서 진짜 표범을 잡았심더. 틀에 걸린 범을 직접 봤어요. 황소만한 검은 줄무늬 점박이였어요. 장정 네 사람이 포대에 담아 목대를 해서 집으로 날랐죠. 마대 포대에 든 표범이 살아나면 그 길로 죽는다 그런 공포감으로 내려왔죠. 아버지가 잡은 표범을 처마 밑에 걸어 놓았는데 꼬리가 땅에 닿더라구요.”
#짐승 가죽 벗겨 호피장수한테 넘겨
산에서 입살이를 하던 김 포수가 잡은 산짐승은 숱하다. 표범이 한 마리, 노란 담비가 네댓 마리, 여우나 족제비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얼굴이 둥글어 산신령이라 부르는 표범은 내로라하는 사냥꾼들도 평생 잡을까 말까하는 귀한 짐승이었다. 영남알프스에서 잡힌 표범은 세 마리가 전해온다. 1944년 주계덤에서 포획된 신불산표범, 1944년 고헌산표범, 1960년 부처바위에서 잡힌 가지산표범이다. 한국전쟁 당시 신불산에서 3년간 산중생활을 했던 신불산 빨치산 차진철이 선리마을 야산에서 흙을 뿌리는 표범을 사살했다고 한다.
포수 아버지를 따라 일곱 살 때부터 산을 드나들었던 김 포수의 아들은 호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아버진 짐승 가죽 벗기는 데도 기가 찰 정도였어요. 주둥이부터 벗겨요. 주둥일 살짝 까서 잘 말려야 합니다. 담요처럼 쭉 펴서 짚동에 걸어놔요. 족제비는 꼬리가 생명이라 빵빵하게 손질해서 말려야 상품가치가 있어요. 집에 모피가 보통 50개는 걸려 있었심더. 고기는 겨울 양식용으로 육젓을 담고, 가죽은 벗겨 말려두면 어느 날 찾아온 모피장수한테 넘깁니다.”
배내고개 넘어 내속, 외속, 원동 배티고개를 넘어 온 호피장수는 동네방네를 돌아다니며 털가죽을 사들였다.
“족제비 털 파이소! 여우 털 파이소! 개털도 된다.”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물건 중의 하나가 범가죽이나 여우 털이었다.
“표범처럼 귀한 호피는 아무한테나 안 넘겨요. 천황산 층층골에서 잡은 표범은 부산 김한근 포수한테 100만원 받고 넘겼습니다. 표범을 사 간 포수는 부산 사직동 임씨라는 사람에게 다시 넘겼어요. 아마 지금도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아버진 호피를 팔아 모은 돈을 벽장 궤짝에 넣어 두었어요. 당시 귀한 미국 돈도 보였어요. 외국을 다니는 삼촌이 호피장수랑 통했어요. 팔순 삼촌 지금 김해에 계십니다.”
배성동 소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