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음의 열쇠를 찾다-김진철作
치매로 기억을 잃어버린 어머니
큰형의 마들렌 선물은 기억해
책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마들렌을 녹인 홍차 한스푼이
마르셀의 어린시절을 불러낸 것처럼
어머니의 잃어버린 시간도 찾아오길
"와 엄마 돈 훔치갔노?”
어머니로부터 난데없이 추궁을 받은 그날은 작년 12월 이맘때다. 그 전화를 받고서 설마 하던 게 우리한테도 왔구나 하고 직감했다. 일주일 후 어머니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을 받았다. 징조는 그 전부터 있었다. 책을 내려고 원고 교정지에 최종 사인을 하던 날이었다. 핸드폰에 어머니의 전화번호가 떴다.
“어머니께서 아파트 출입문 앞에 앉아 계시네요.” 낯선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못 여십니다. 전화 바꿔 드릴게요.” 잠시 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야야, 내가 와 이렇노. 집에를 몬 드가겠대이.”
내가 아주머니에게 비밀번호를 말해주고서야 어머니는 아파트로 들어가실 수 있었다. 그때가 치매의 시작이었음에도 나는 애써 어머니의 기억력이 나빠진 거라고 치부했다. 여든이 되도록 유치원에서 이야기선생님으로 근무한데다 노인회 회장으로 활동하셨기에 어머니가 치매는 안 걸릴 거라 생각한 것이다. 당신은 서향인 옛집 툇마루에서 해가 질 때까지 이야기보따리를 푸시곤 했다. 일제 강점기 때 만주로 이주했던 어린 시절 이야기는 한 편의 흥미진진한 소설이었다. 시커먼 땟국물이 목욕탕에 흘러넘치던 강원도 탄광촌(풍곡)에서 살던 시절과, 어린 큰아들을 친정집에서 공부시키던 때며, 둘째 아들을 야간 중학교에 보내야 했던 처지와, 하나뿐인 딸을 배구선수를 시켜 마산까지 유학 보낸 사연들을 쏟아내셨다. 어머니의 입에서 되살아난 우리 집안의 과거는 ‘영원한 현재’와 다름없었다. 살아가면서 밥만큼 중요한 게 또 있다는 걸 어머니를 통해서 나는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어머니가 문 앞에서 주저앉은 일이 있은 뒤로 한 달 치 생활비와 통장까지 잃고서야 의료보험공단에 가서 재가요양을 신청했다. 이때가 작년 동짓날이다. 나는 오래된 책장에서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꺼내 들었다. 그냥 읽고 싶었다.
요즘은 새벽에 자주 벨이 울린다. 내가 받으면 곧장 전화를 끊으신다. 어쩌다 통화가 되면 액정에 뜬 번호를 지운다고 그랬지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하신다. 당신이 번호만 눌러보는 전화는 자식들이 보고 싶다는 신호 같다. 어머니가 늦은 아침에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야얘이, 늬 새이(형)가 머 보내왔네. 빵 같은 게 들었더라. 엄마 다 못 묵는다, 한 통 가져가래이.” 연말 선물로 큰형이 보낸, 당신이 좋아하는 ‘밤과자’이겠거니 했다. 박스를 열어보니 조가비 모양의 쿠키, 마들렌이 들어 있었다. “여름에도 보내더니 와 자꾸 이거를 보내노?”
물건을 간직해두고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어머니가 여름에 생신 선물로 받은 마들렌을 기억하시는 거였다. 혀에 백태가 끼어 맛을 잘 못 느끼는 데도 큰형이 부쳐온 쿠키는 잘도 자신다. 벌써 세 개째다. 통통한 그걸 들고 테라스로 가신다. 그리고는 강아지 옆에 쪼그리고 앉아 바깥세상을 내다보신다. “어야! 언제인고는 모리겠는데 늬 큰새이가 날 목욕시키 주고 갔대이.” 소녀처럼 손바닥을 뺨에 대고 흐뭇해하시는 표정이다. “그라고 설거지도 해주더라. 갸가 많이 컸더래이.”
나야 일주일에 한 번은 가지만 어머니를 씻겨드리는 건 아들로서 미처 생각지 못한 일이다. 그날 형은 어머니와 같이 밥을 먹고, 설거지에다 목욕까지 해드리고, 하룻밤 자고 간 것이다. 나는 차려주는 밥을 먹고 주는 걸 받아올 뿐 설거지를 하거나 목욕을 해드리거나 어머니의 곁에서 자고 오지는 못했다.
그런 내가 홍차를 끓이려고 물을 받는다. 어머니와 함께 마들렌을 녹여 먹고 싶어진 것이다. 당신은 햇볕이 잘 드는 거실 한가운데에서 화장을 하고 계신다. 여차하면 홱 돌아보며 요샌 와 그래 잘 안 오노, 내 통장 어데 갔노, 작년부터 내가 와 이러노, 너그 아부지 제사도 모리겠대이, 으째 밥 묵는 거는 안 잊아뿌는고 몰라, 하실게다.
그렇다. 기억을 잃는다는 건 경험의 백지 상태로 돌아가기에 생각을 떠올리는 기준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 우리는 한 사람의 걸음걸이와 목소리, 생김새, 제스처, 시공간을 함께한 경험을 떠올리고서 그 사람임을 알지 않는가. 그래서 기억을 잃는다는 것은 빈틈없이 살아온 시절마저 건너뛰어 버리는, 생의 함정과도 같은 것이다.
손거울을 들여다보며 이 색 저 색 입술을 칠하시던 어머니가 부끄러운 듯 거울을 감추며 생글생글 웃으신다. 머리는 순백인 할머니인데 얼굴 표정은 영락없이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 흰머리 소녀다. 그 샤방샤방한 얼굴을 보면서 나도 소년처럼 웃고 만다. 그리고 형이 왜 중요한 날에 마들렌을 선물하는지, 찻물이 끓을 동안 그 이유를 가늠해 보는 것이다. 마들렌을 녹인 홍차 한 스푼이 마르셀의 어린 시절을 불러낸 것처럼 우연일지라도, 어머니의 잃어버린 시간이 찾아오길 바라며.

■장창호씨는
·1984년 월간문학 신인상 당선
·롯데월드 예술극장 PD, 소극장 이솝·문화가족 길 대표 역임
·한국희곡문학상 강아지똥상, 울산문학상, 창릉문학상 수상
·희곡집 <바위에 새긴 사랑> <ㅅㄹㅎ> <장창호삼국유사>(전 12권)<ㅅㄹㅎㅅ>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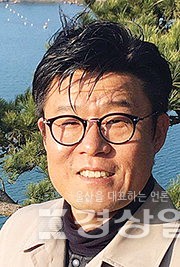
■김진철씨는
·충남미술대전·마산315미술대전 초대작가
·한국미술협회·(사)환경미술협회 회원
·전국조각가협회 회원
·울산미술대전 운영위원
·울산미협 조각분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