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산을 이고 사는 사람들 - (9)배내골 범장군과 포호술(捕虎術)

조선총독부의 철권통치가 서슬 퍼렇던 1924년 2월 하순. 천하오지 배내골에 짙게 깔린 어둠을 뚫는 횃불 몰이꾼들이 있었다. 그들이 내쉬는 숨소리는 거칠었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계곡 물소리는 그윽하다. 횃불 무리를 이끄는 우두머리 ‘범장군’은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은 전설의 인물이었고, 총을 든 두 포수는 그의 휘하에 있는 ‘불칼’과 ‘배내골 총잡이’였다. 날고 기는 그들이 이곳엘 들어오게 된 것은 망나니 백호(白虎)를 거세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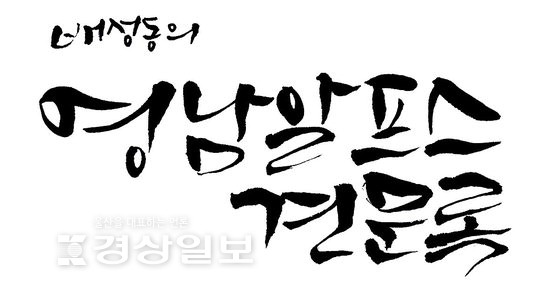
동원된 몰이꾼들은 근동 고을에서 차출된 사람들이었다. 아랫도리에 각반을 차고 설피를 신은 홀갱이꾼, 머리에 흰 쓰개를 틀고 헐렁한 홀대바지를 입은 산판꾼, 족제비를 잡으러 다니는 호피꾼, 그리고 배내골 숯쟁이부터 화전 밭뙈기 농사가 전부인 가난한 글쟁이도 동냥 몰이꾼이기는 매 한가지였다.
횃불, 설피, 북, 징, 꽹과리, 나팔, 찹쌀떡, 물을 지급받은 몰이꾼들은 독 안에 든 쥐나 다름없는 아득한 왕방골로 들어갔다. 낙동정맥이 남으로 내려오다가 다시 서 동진하는 왕방골은 하늘이 막힌 협곡이었다. 호랑이는 사시장철 충분한 사냥감이 있는 물가를 선호했고,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은 표범은 관찰과 잠복이 용이한 높은 지대를 선호했다.
영험한 백호가 사람까지 해치자 포획 명령 내려져
범장군 앞세워 불칼·배내골 총잡이 백호몰이 나서
설피 신은 몰이꾼들이 촛대바위서 억새밭에 불질러
후손들은 호랑이가 불속에서 살아남았다는 믿음가져
산을 오를수록 냉골 바람은 거세졌다. 늙은 여우도 눈물을 짜낼 만큼 살을 에는 냉골 바람은 산기슭에 쌓인 눈을 발목까지 차오르게 했다.
“역시 설피는 고로쇠나무로 만든 게 좋아. 산 벚나무도 쓰지만 고로쇠나무로 다듬으면 물이 안 스며들어 오래 가지.”
발자국 추적으로 짐승을 쫓는 몰이꾼들에게는 설피와 막대기는 긴요했다. 막대기는 짐승을 몰이용 스틱으로도 가능했고, 끝에 달린 날카로운 창은 토끼나 노루를 잡을 수 있었다.

몰이꾼들이 음지 눈밭에 찍힌 짐승 눈발자국을 찾아내었다. 범장군이 다가가 눈발자국 가까이로 횃불을 갖다댔다. 노루, 승냥이, 여우, 담비 따위의 짐승 발자국들이었다. 멧돼지가 파놓은 늪지 웅덩이에는 사발만한 호랑이 눈발자국도 발견됐다. 물가 늪지는 일종의 공중목욕탕 같은 곳이었다.
그때, 산천초목이 들썩거리는 호랑이 우짖는 소리가 간월재 방향에서 들려왔다. 백호가 있는 방향을 알아차린 범장군의 서릿발 눈깔이 희번덕거렸다.
범장군은 즉시 몰이꾼을 세 패로 나눠 간월재 한 방향으로 모는 계책을 짰다. 불칼 포수가 이끄는 패거리는 옥봉과 간월산 정상을 거쳐 간월재로 이동하기로 하고, 배내골 총잡이가 이끄는 패거리는 신불산 북능에서 간월재로 내려오게 하였다. 나머지 몰이꾼은 범장군과 함께 왕방골을 치고 오르기로 했다. 몰이한 백호가 부채꼴 포위망에 들면 억새밭에 불을 지르기로 했다.
“범은 지나가는 시기가 있어. 오늘 밤을 놓치면 안 돼.”
범장군이 포위망을 설명하며 거뭇한 수염을 쓸었다.
“알았소. 우린 신불산 위에서 징을 치고 몰아올 테니 총질이나 잘 하쇼.”
납작모자를 눌러 쓴 배내골 총잡이가 말했다. 그는 체격이 크고 균형 잡힌 몸이었다.
“그러면 우린 짐승이 내려 올만한 길목에 잠복해 있겠소.”
“우리도 짐승을 잡아 봐서 잘 알지. 틀에 잡은 짐승은 비가 오면 썩어버려 재미없어. 논에 나락이 썩더라도 산짐승 쫓는 게 사냥꾼들의 피야, 피!”
짙은 눈썹을 치켜뜬 불칼 포수가 잰걸음을 했다. 뒤이어 배내골 총잡이도 가파른 신불산으로 향했다.
범장군 패거리는 어둠을 뚫고 왕방골을 내쳐 올랐다. 횃불 몰이꾼들은 거대한 고드름을 매단 파래소폭포를 거쳐 칼로 빗은 눈이 곧장 찬바람이 되는 죽림굴 냉골을 파고들었다. 음기가 흐르는 죽림굴에 있던 박쥐가 횃불에 놀라 날뛰었다. 바위굴 바닥에서 발견된 호랑이 배설물에는 긴 여자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다. 배내골에서 실종된 아녀자의 호식(虎食)으로 짐작이 갔다.
백호는 두려운 존재였다. 포수라면 영험한 호랑이를 함부로 잡으려들지 않는다. 간이 배 밖에 나온 범장군도 상대가 상대인 만큼 두려움에 떨었다. 범장군이 호랑이를 잡는 것은 두 가지의 경우였다. 상처를 입어 사냥이 불가능할 경우, 그리고 사람을 잡아먹은 경험이 있는 경우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두 경우를 다 가진 백호는 거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백호가 신불산과 재약산 비알에 나타난 것은 달포 전이었다. 한 곳에 머물지 않는 백호는 하루에 백리를 쏘다닌다. 간월재를 넘나들던 소장수가 백주 대낮에 변을 당하는 호사가 생겼고, 잇달아 마을에서 키우는 염소와 개가 사라지곤 했다. 급기야 배내골에 사는 아녀자까지 실종되는 사단이 벌어지자 놀란 배내골 주민들이 해수구제(害獸驅除) 진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늙은 암놈이라네. 사람 맛을 본 놈이라 걱정이 태산이야.”
“범이 사람 한 명 잡아먹으면 수염 하나가 더 생긴대.”
‘범과 처녀는 안 봐도 안다잖아. 영리한 놈이라 밤에 머리 감은 처녀를 귀신 같이 알아보곤 물어간대. 자네 집에도 밤에 머리 감지 말라고 단속시키게.”
“하긴, 아는 길도 밤길은 걷지 말랬지.”
“표범이 뒤에 따르면 위험하고, 앞에 있으면 안전하대.”
칠흑 같은 숲속을 빠져나왔다. 갈마처럼 잘록한 동쪽 간월잿마루에 억새 달빛이 고고하게 일렁였다.
그때, 간월재 촛대바위에서 부리부리한 눈빛이 번쩍거렸다. 그는 횃불을 치켜들어 서릿발 눈깔을 굴렸다. 화덕 같은 눈빛은 백호였다. 눈빛은 가까이서는 빨간 두 개, 멀리서는 파란 하나가 됐다. 범장군은 간월산과 신불산 능선에 올라선 몰이꾼들에게 횃불을 흔들어 신호를 보냈다.
횃불 몰이꾼들이 북과 징을 치고 나팔을 불며 일제히 몰이를 시작했다. 몰이는 위에서 아래로 진행됐다.
워이, 워이!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며 간월재 방향으로 밀고 내려왔다. 함성에 놀란 짐승들이 산 아래 억새밭으로 뛰었다. 간월재 촛대바위에서 지켜보던 백호가 기다렸다는 듯이 억새밭으로 뛰어들어 짐승들에게 달려들었다.
이 때를 이용해 몰이꾼들은 억새밭에 불을 질렀다. 포위망에 든 백호가 빈틈으로 몰리면 그쪽에도 다시 불을 놓았다. 세상에 내려오지 말고 산속에서 도나 닦고 있을 팔자였던 백호는 불의 포위망에 완전히 갇히고 말았다.

불에 탄 억새는 거짓말처럼 죽어 부활을 하지만, 털이 있는 호랑이에게 불은 큰 위협이었다. 억새밭에서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았다. 맹렬하게 타들어가는 억새불 소리, 이리저리 날뛰는 짐승들의 비명으로 뒤섞인 간월재 억새밭은 아비규환이었다.
“거세공포증에 시달려온 백호가 무시무시한 불살을 맞게 되는구나.”
억새불에 감히 대항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백호를 본 몰이꾼들의 함성은 뜨거웠다.
배내골 후손들은 여전히 범이 살아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니깐, 내가 19살 때니깐 1980년 쯤 됐을 겁니다. 천황산 층층골 7부 능선에서 범틀에 걸린 범을 봤어요. 놈이 달려들어 마취 총으로 쏘아 잡았어요. 황소만한 검은 줄무늬 점박이였던 걸요.”
배성동 소설가

